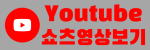프랑스에서 무성영화 변사극을 하는 강창일 작가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목록
본문
지난해 10월 파리의 아시아 전문 서점인 르 페닉스(Le Phénix)에서는 프랑스에서 불어권 독자를 위하여 프랑스 출판사에 의해 한국 영화 관련 책을 펴낸 강창일 작가의 ‘독자와의 만남과 사인회’가 있었다. 그런데 여느 행사와는 좀 달랐다.
한국의 무성영화인 « 검사와 여선생 » (1948)을 불어로, *변사극을 작가가 직접 시연해 보였다. 아코디언 음악에 맞추어 구성진 변사극을 하는데, 좌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변사로 변신한 강창일 작가는 무성영화 속 주인공의 대사와 함께 극중 상황을 끈임없이 떠들어 대고 : 추운 날씨에 배가 고프다고 하는, 무겁고 심각한 상황을 변사의 화려한 언변으로 관객들이 웃기 시작한다.
*« 변사 »란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육성으로 해설을 담당하는 나레이터(Narrator)로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말하거나 영화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무성영화의 해설자이다.

강창일 작가이자 변사. 파테(Pathé) 극장 변사극에서
강창일 작가는 프랑스에서 이미 2권의 한국 영화 관련 책을 발간했다. 첫번째 책 <한국 영화의 시작, Les débuts du cinéma en Corée>이 2020년 9월에, 두번째 책인 <한국현대 영화, 기생충의 전야 Le cinéma coréen contemporain, A l'aube de Parasite >이 2023년에 나왔다.
그는 연극영화 전문가로서 극작가, 연출가, 시나리오 작가, 다큐 및 극영화 감독 그리고 연극영화역사 작가이자 무성영화의 변사다. 파리 4 대학 (소르본, Sorbonne)에서 근대 문학(lettre moderne)을 전공했고 모엥드로 (Isabelle Moindrot) 교수 (Paris 8 대학) 와 피사노(Giusy Pisano) 교수(프랑스국립영화학교/ Ecole nationale supérieure Louis-Lumière)의 공동 지도로 초기영화 역사를 전공하여 Esthétique, sciences et technologies des Arts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술활동 및 영화상영회, 변사공연 등을 통하여 프랑스에서 한국영화와 문화를 알리고 있다.
강 작가의 변사극이 궁금해서 만났다. 인터뷰 내내 그가 진행하는 변사극처럼 특유의 해학과 유머가 넘쳐났다.
프랑스에서 한국영화 책을 발간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변사극을 하게 되신거예요 ?
-« 한국의 영화의 기원은 무엇일까 ? »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초기영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 분야의 권위자인 프랑스국립영화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Louis-Lumière)의 피사노(Giusy Pisano)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라는 쟝르가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어서 연구의 관심사는 « 한국에 도착한 영화 »를 거쳐 « 한국영화의 시작 »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895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영화의 « 유료 공공 상영 »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화는 세계로 퍼져 나갔고 한반도에도 영화가 도착합니다. 1903년 6월 23자 황성신문은 한반도에서의 유료 공공 영화 상영회를 광고합니다. 장소는 한양(서울)의 일명 동대문활동사진소. 당시 고종은 서울의 근대화를 위해 동대문에 전기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전기를 이용하는 전차를 개통하게 되었고 공사 대금을 갚아야 하는 이유로 발전소 한 공간에서 영화의 유료 공공 상영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조선의 관객들은 이제 전차를 타고 동대문으로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합니다. 입장료는 사용한 전차티켓. 그리고 외국담배업체들이 상영회 사업에 합류하기 시작하여 피우고 남은 담배갑도 입장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전차를 타고 도착한 동대문활동사진소의 영화상영회는 이렇게 야외에서 어둠이 내리면 시작되었습니다. « 비가 오는 날 빼고 ».
1935년에 개봉한 영화<춘향전>으로 한반도는 유성영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즉 그 이전까지의 초기영화의 시기를 무성영화의 시대라 부르는데요. 초기영화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무성 영화라는 단어의 « 무성 »입니다. 소리가 없다는 의미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필름에 소리를 붙이는 기술이 없었던 시기를 말하죠.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극장 안에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전세계의 각 지역마다 극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프랑스는 음악으로, 한반도는 변사의 살아있는 육성으로 극장에 소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 조선신파 활동사진 변사공연 »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 독특한 형태의 상영방식에 20세기 초 한반도의 관객은 울고 웃었고 변사는 한국영화계의 스타영화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변사의 인기는 대단하였죠. 그리고 한반도의 경우는 당시 영화 제작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대안을 모색하던 중 변사가 영화제작에 동원되었습니다. 변사는 시나리오, 감독, 편집에 영화 속 주연배우까지 수행하는 만능 영화인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성영화 « 검사와 여선생 » (1948)의 시나리오 작가는 김춘광 (본명 김조성)이라는 우미관 극장의 스타 변사 출신으로 《흥부전》, 《춘향전》, 《비련(悲戀)의 곡(曲)》 등의 영화에서 주연배우로 활동하였던 영화계의 스타였어요.
저는 한국의 한 영화제 프로그램 팀에 참가하여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초기 영화에 대한 이벤트로 변사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우리나라의 마지막 변사라고 불리던 신출 선생께 연락하여 마침내 아주 오래된 극장에서 변사극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변사에게 사사를 받으셨나요 ?
-사사는 없었고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게 됐어요. 변사인 신출 선생은 술을 좋아하셨는데, 밤마다 술을 드시면서 살아온 변사의 일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변사 수업이었지요. 그때 말씀하시는 걸 다 일일이 적었어요. 저에게는 성경 말씀 같았어요. 신출 선생과 미국의 한 초기영화를 변사극으로 공연하려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자막을 번역을 해서 드리겠다고 하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공들 이름만 알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니 그 분 입에서 변사의 언어가 신들린 무당처럼 그냥 술술 나와요. 워낙 오래동안 시골을 돌며 변사공연을 많이 해서 어떤 영화가 와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변사 신출 선생의 머리 혹은 가슴 속에 이미 몇 천 문장의 텍스트가 들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주 놀랐죠.

강창일 작가이자 변사
조선의 변사에는 그 스타일 상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슬픔과 아픔을 강조하는 변사 그리고 코믹에 강한 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신출 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예요. « 변사가 울어야 관객이 운다 »라면서. 저도 영화의 후반부에는 신파의 중요 요소인 파토스를 강조합니다만, 저는 코믹한 양상도 좋아해요. 저는 신출 변사와는 달리 한 편의 영화를 수차례 미리 반복하여 보는 편이에요.
<검사와 여선생>에서 여선생이 살짝 실수로 넘어지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제가 « 우쁘-라 » 라고 조그맣게 말하면 프랑스 관객들이 킥킥대기 시작합니다. 상영 중에는 상황에 따라 영화의 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도 합니다. 배우가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다가 실수로 카메라를 처다 보면 « 너 자꾸 카메라 쳐다 볼래 ?»라든가 필름이 흔들리는 경우 혹은 전기가 나가는 경우 « 죄송합니다 » 가 아니라, « 아~날씨가 추우니 필름도 떠는구나 » 라고 능청을 떨기도 하죠. 저는 변사의 이러한 능청스러움을 좋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던 변사 신출 선생과의 또 다른 점이라면……저는 한국어로도 변사공연을 하지만 프랑스어로도 변사공연을 한다는 점도 다르네요.
변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나요 ?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변사 辯士라고 하여 벤시 (일본) 피안수(중국) 등으로 불렸고요. 독일에서는 ‘Kinoerzähler’ 혹은 ‘Erklärer’, 스페인에서는 해설자 ‘explicadorfk’ 라 불렸고 폴란드에서는 지식인, 이란에서는 번역가, 벨기에에서는 ‘pitre’ 혹은 ‘régisseur’, 네델란드에서는 영화설명가란 의미로 ‘Filmuitlegger’, 아프리카의 자이레에서는 배우란 의미로 ‘Comédien’이라 불렸어요.
프랑스에서는 ‘Bonimenteur’ 라 하는데 « 약장수 », 혹은 « 야바위꾼 » 이란 의미입니다. 프랑스는 영화 상영 중 음악을 연주하는 일종의 시네 콘서트 스타일이 강하여서 ‘Bonimenteur’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시골 시장을 방문할 때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의 외침에 주목합니다. 이는 제가 프랑스어로 변사극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돼요.
반면 캐나다에서는 « 캐나다로 이주한 프랑스인들의 Bonimenteur 연구 »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재현하는 변사 즉 ‘Bonimenteur’ 없다는 점이 아쉽죠. 그러고보니 제가 유일한 ‘Bonimenteur’네요.
변사공연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초기영화의 메카인 파리의 파테( Pathé)재단에서 했던 변사극은 바로 매진이 되었어요. 한국초기영화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영화가 제작되기 이전 닭모양의 로고가 들어간 영화를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파테 영화사의 영화죠. 파테의 영화를 보고 자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고, 프랑스에서 이제는 사라진 변사Bonimenteur 공연을 보고 들으며 영화의 출발국이자 종주국인 프랑스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변사극의 독특한 점은 어떤 건가요 ?
-변사는 단순한 일상적인 웃음과 슬픔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웃음과 슬픔을 멘트로 관객과 호흡하죠. 1920년 전 후 한국영화계의 스타는 변사였습니다. 1919년 10월 27일 드디어 단성사에 모여든 한국 관객은 처음으로 한국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영화의 기획 그리고 편집을 염두한 현장 제작까지 모두 변사가 진행을 하였고 물론 상영 중 변사가 이 영화의 해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3월에 독립만세운동을 경험한 일본 경찰들이 잔뜩 긴장을 했죠. 1차 검열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검열을 피하기위해 이야기는 간접화법을 사용합니다.
« 행복한 가정에 계모가 들어옵니다. 그녀는 깡패들을 동원해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던 아들은 마침내 응보의 칼을 뽑게 됩니다 ».
최종검열이 남았는데 그건 바로 변사의 « 말 »이었죠. 즉, 변사가 어떠한 멘트를 하느냐에 따라 극장은 폭동 혹은 혁명의 장소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해인 1920년에 영화를 보러 온 관객으로 서울 종로의 YMCA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들은 프랑스 영화 레 미제라블(1907년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영화의 런닝 타임이 3시간을 넘기 때문에 변사 목이 찢어지겠다 싶어 당시 최고의 변사 두 명이 호출됩니다. 역시 일본 경찰도 바짝 긴장합니다. 더군다나 영화 속에는 민중의 봉기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변사는 모두 워낙 경험이 많은 지라 감시하는 일본 경찰을 가지고 놉니다. 경찰이 한 눈을 팔 때 « 아 ! 여러분 ! 파리의 성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꼬챙이와 몽둥이를 들고 경찰의 총부리와 맞서고 있을 적에……네 이놈들 ! 잘 보거라 ! 우리 조선인들은 가만히 있을 걸로 아느냐 ? » 하다가 화장실 다녀온 경찰이 검열석에 앉으면, « 아니 이런 무례한 폭도들이 있을까 ?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도당들 일세. 허허 !이러할 때 우리의 팔찬이, 의리의 사나이 장팔찬(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 »
종로는 물론 서울의 골목 골목에서 « 장팔찬 »을 외치는 소리로 서울의 하늘을 메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특수한 정치상황에 놓인 한반도, 지배하는 자와 지배하는 자, 감시하는 자와 감시를 당하는 자의 긴장 속에서 한국의 변사는 « 텍스트의 구멍 »을 기막히게 활용하여 수없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집단적 무의식을 건드리는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는 제가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 존재했던 변사공연문화와 관련한 초기영화 역사연구에서 그 어떤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한국적 변사공연의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
-우선 변사의 수사학과 웅변술이 극장을 소리로 가득 채웠던 초기영화의 문화유산인 변사공연이 전세계 전지역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상황이어서 변사공연을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제안하려 하고요. 그리고 공연의 시간을 줄여 일종의 찾아가는 « 맛보기 공연 »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파테재단에 문의했어요. 한국의 서울에서 1920년도에 소위 대박이 난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년 전인 1907년 제작된 (무성)영화 레 미제라블이란 말이지. 그걸 어떻게 볼 방법이 없겠는가 ? 라고 문의하니 파테재단에서 « 복원작업 중이었고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음 »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 영화 연구자로서 그 영화를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1920년 종로의 한 복판에서 당시 최고의 두 조선신파 변사가 해설하였던 1907년 프랑스 작품 « 레 미제라블 »도 이제 저의 레파토리 리스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한국에 가서는 한국어로 « 조선신파 활동사진 변사극 » 이란 명칭으로 공연하고 프랑스에서는 현존하는 유일한 Bonimenteur로서 « spectacles cinématographique de bonimenteur »이라는 공연 명칭으로 불어로 하게 되겠네요.
<파리광장편집부>
관련자료
-
다음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