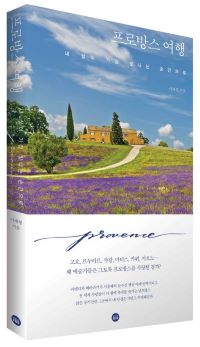이재형 작가 <프로방스 여행> 연재 (1)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목록
본문
파리광장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이재형 작가의 프랑스 르퓌 산티아고 순례길 저서
<프랑스를 걷다>와 <나는 왜 파리를 사랑하는가>연재 이후,
<프로방스 여행-내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연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연재를 허락해 주신 이재형 작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프로방스로 떠나는 아침
나는 남프랑스의 한 도시에서 16년 동안 살았다. 지중해에 면한 그 도시는 1년에 300일 이상 해가 나올 정도로 연중 온화하고 화창했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았고 여름에는 덥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춥지 않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였다.
그러다가 파리에 올라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날씨였다. 파리 날씨는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지중해 도시의 그것과는 정반대였다. 하늘이 거의 항상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좀처럼 해를 보기 어려웠고, 비도 자주 내렸다. 파리지앵들이 해만 나왔다 하면 집 밖으로 몰려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왜 파리를 사랑하는가》에서 얘기했다시피 파리에서 나를 괴롭힌 우울증은 예술의 힘으로 서서히 치유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 켠에는 늘 프로방스의 푸근한 날씨와 눈부신 태양, 시리도록 파란 바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마을들, 끝없이 펼쳐진 보라색 라벤더밭, 5월이면 온 산야를 붉게 물들이는 개양귀비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프로방스의 풍경은 다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나를 부추겼다.
니콜라 부비에는 《세상의 용도》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억누르기 힘든 욕망, 그걸 뭐라 불러야 할지, 사실 우리는 모른다. 무엇인가가 점점 더 커지다가 어느 날인가 닻줄이 풀리면, 반드시 자신감이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떠나고 보는 것이다.”
2022년 가을 어느 날, 나는 본능을 따르기로 하고 일탈을 감행했다. 2010년 산티아고 순례를 처음 떠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잡혀 있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랴부랴 짐을 꾸려 파리 가르드리용 기차역에서 프로방스의 도시 아를로 가는 열차에 무작정 올라탔다.
기차가 아비뇽을 향해 접근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확 달라진다. 프로방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리그(garrigue) 지형이다. 마치 키 작은 나무들만 서 있는 사막 같다. 키 큰 나무는 보이지 않고 가뭄에 강한 관목들만 땅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래는 참나무 숲이었으나 사람들이 개간해서 밭을 만들거나 양이나 염소를 방목해서 키 큰 나무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키 작은 나무들만, 지반이 석회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물이 쉽게 흡수되는 땅속에 뿌리를 더욱 단단히 박은 채,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아를(Arles) :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아를(Arles)은 파리에서 683km 떨어져 있으며 기차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 론강과 황량한 크로 평원, 야생의 카마르그, 나지막한 알피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이 도시는 프랑스의 코뮌 중에서 가장 넓다(면적 75,000ha).
역사의 도시 아를에는 원형경기장과 레잘리스캉(공동묘지), 고대 극장, 콘스탄티누스의 공중목욕탕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곳이 옛 로마령 갈리아의 주요 도시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된 이 도시에는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고대 박물관(로마 시대)과 아를라탕 박물관(프로방스의 전통), 레아튀 미술관(현대 예술과 사진), 카마르그 박물관, 반 고흐 재단 등 다양한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아를은 또한 축제의 도시이다. 봄과 가을에 열리는 페리아 축제 때는 카마르그의 가르디앙들이 키우는 황소를 원형 경기장에 풀어 투우 경기를 즐긴다. 수용 인원이 1만 2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 경기장은 1세기 로마인들이 환호하며 열광했던 바로 그곳이다. 또 매년 여름에는 1970년에 시작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국제사진전이 열린다.
문화의 도시이기도 한 아를은 끊임없이 예술가들을 불러들였다. 반 고흐는 친구 고갱과 함께 머물렀고, 투우 경기를 좋아하던 피카소는 이곳에서 2점의 유화와 57점의 데생을 남겼다.

프랑크 게리의 루마 아를 타워
이 도시는 현대 예술을 수용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아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현대 건축물 루마 아를(Luma Arles)과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한국 현대 예술의 거장 이우환 미술관(Lee Ufan Arles)도 있다. 또 아를에서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레보드프로방스(Les Baux-de-Provence) 마을에는 버려진 채석장을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음악과 함께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빛의 채석장(Carrières de Lumières)이 있다.

이우환 미술관

레보드프로방스(Les Baux-de-Provence)의 빛의 채석장(Carrières de Lumières)
그렇긴 하지만 나를 아를로 끌어당긴 것은 무엇보다도 고흐(1853~1890)다. 그는 프로방스에서 겨우 2년여밖에 살지 않았다. 하지만 내게는 그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도는 것처럼 느껴진다. TGV는 3시간 반 만에 나를 아를에 내려주었다. 무겁게 가라앉은 탁한 파리의 공기와는 달리 아를의 공기는 그야말로 가볍고 투명하며 상큼하다.
아를에서 발견한 예술의 미래
1888년 2월 2일, 반 고흐는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15시간을 여행한 끝에 아를에 도착했다. 그는 이제 프로방스의 강렬한 빛과 눈부시게 선명한 하늘, 투명한 공기 속에서 꽃을 피운 과실수와 협죽도, 보라색 땅, 올리브나무의 은빛, 실편백나무의 진한 녹색을 그리게 될 것이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
“난 새로운 예술의 미래가 프로방스에 있다고 믿어.”
반 고흐는 처음에 역 근처 사창가에 있는 호텔에 짐을 풀었다가 며칠 뒤에 라마르틴 광장 30번지의 역전 카페로 거처를 옮긴다. 그는 이 지역을 부지런히 걸어 돌아다니며 자연과 하늘, 땅, 그리고 거기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순박한 사람들을 그린다.
6월 초에는 ‘푸른 바다와 하늘의 효과’를 캔버스에 표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지중해에 면한 생트마리드라메르 마을에 가서 닷새 동안 머무르며 〈생트마리드라메르의 바다〉(1888년, 푸시킨 국립미술관)와 〈생트마리드라메르 해안의 낚싯배〉(1888년, 반 고흐 미술관) 등의 작품을 그린다.
이때 그린 그림은 그가 이후에 해바라기와 밭, 정원 등의 그림에 과장된 색들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예고한다.
주로 풍경화를 그리던 반 고흐는 초상화도 그리고 싶어서 모델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그처럼 역전 카페를 드나들던 조제프 룰랭이었다. 이 사람은 우체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소포를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지기였다. 반 고흐는 1888년과 1889년에 이 부부와 세 아이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는 또 아를 근처의 퐁비에유 마을에 사는 미국 화가 다쥐 맥라이트의 소개로 알게 된 벨기에 출신의 인상파 화가 〈으젠 보슈의 초상화〉도 그린다. 반 고흐는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으젠 보슈를 살짝 “시인처럼 그려놓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은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그림의 배경이 노란 별들이 반짝이는 진한 군청색 밤하늘이어서 〈화가와 별〉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하늘은 그가 론강의 하늘을 그린 작품 〈별이 총총한 밤〉에 다시 등장한다. 반 고흐는 이 그림을 자신이 살던 노란 방의 침대 위에 걸어놓았고, 실제로 〈노란 방〉의 첫 번째 버전에 등장한다.
이와 동시에 그는 정물화 연작도 그리기 시작하는데 〈해바라기〉 연작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이미 1887년 파리에서 살 때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해바라기를 그린 적이 있었다. 아를에서는 1888년 8월과 그다음 해 1월 사이에 모두 6점으로 이루어진 해바라기 연작을 그린다. 이 시대에 이처럼 다양한 색상의 노란색을 사용했다는 것은 가히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구성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색을 사용한 이 작품들에서는 일본 판화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진다.

고흐의 <해바라기> 연작
일본 판화는 대담한 구도와 단순화된 형태, 강렬한 색채, 원근법과 명암의 부재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버리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추구하던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화가들은 일본 판화에 큰 영향을 받았고, 반 고흐도 그중 한 명이다.
일본 판화에 대한 매혹은 1886년 그가 일본과 일본 문화에 열광하고 있던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화상 지그프리드빙으로부터 한꺼번에 600점의 우키요에(일본 에도시대에 서민 계층을 기반으로 발달한 풍속화)를 사들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고 나서 반 고흐는 파리를 떠나 프로방스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 섬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와 일치하는 ‘제2의 일본’을 발견했다. 1888년 초,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연 속에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일본 화가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쓴다.

고흐의 <꽃을 피운 아몬드나무>
반 고흐가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아 아를에서 그린 그림 중에서 특히 〈꽃을 피운 아몬드나무〉는 우리 눈에 익숙하다. 생폴드모졸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1890년 2월, 반 고흐는 갓 태어난 조카에게 선물하려고 흰색 아몬드꽃이 푸르른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난 이 그림을 그렸다. 이른 봄에 프로방스에 가면 새로운 생명과 희망, 부활을 상징하는 이 나무가 꽃을 피운 모습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반년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글 사진: 이재형 작가>
이재형 작가의 <프로방스 여행>-내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관련자료
-
다음
-
이전